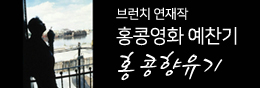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 수상,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수상, 아카데미 시상에서 다각도의 상을 받기까지, 영화 ‘기생충’은 한국 영화사를 다시 쓰는 것과 동시에 세계 영화사에서도 대중과 평단을 한 번에 사로잡은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업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평단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영화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았다. 가장 한국적인 영화를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것에 대하여 감독 봉준호는 “1인치의 장벽”, 즉 “자막”을 뛰어넘는다면 전 세계인이 더욱더 멋진 영화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과 “자본주의”가 메인 키워드가 된 현재의 사회를 풍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가장 적합한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과연 봉준호는, 영화 속 기택의 가족의 시선에서 사회를 풍자하고 있을까?
가족 전원이 백수로 살아가고 있는 기택의 가족은 기우가 박 사장네 집에서 고액과외를 시작하며 희망을 보게 된다. 재수를 거듭하고 있는 기우는 재학증명서를 위조해, 고액 대학생 과외를 시작하게 되며 기우의 가족인 기정 또한 박 사장 가족의 아들의 미술 과외를 진행하게 된다. 그를 이어 기우의 어머니와 아버지 기택 또한 박 사장네 고용되게 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학력을 우선적으로 채용된 기우와 기정, 누군가의 소개 즉 믿을 법한 사람의 공천으로 채용된 기택과 아내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공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특히 새로운 가정부인 기택의 아내, 충숙이 고용됨으로 인하여 해고된 문광의 모습은, 공정하지 않는 채용 과정에서 해고된, 부당해고 피해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문광은 박 사장네 지하실의 자신의 남편을 감추고 봉양하며 살아왔으나, 기택 가족의 등장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다. 충숙의 등장으로 자신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과 자신의 남편을 돌보아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충숙에 대한 분노로 문광과 그녀의 남편은 박 사장네 가족이 캠핑을 간 사이에 기택 가족을 공격하게 된다. 이 두 가족의 다툼은 하나의 희극으로 연출된다. 사회적 하층민와 극하층민 사이에서 일어난 일자리와 생존을 둔 싸움, 즉 계층 이동을 향한 싸움에 대한 감독의 의도는 무엇일까? 관객들은 이 희극으로 연출된 싸움을 보고 일종의 흥미와 재미를 느낀다. 카메라 워크와 배경음악의 조화는 이 싸움이 마치 예술의 부분까지 표현하는 듯 연출된다. 그러나 관객이 이 장면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서’이다. 즉 당사자성의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들의 비극을 희극으로 관람할 수 있다.
반면, 박 사장네 또한 감독의 연출을 통해 우스꽝스럽게 연출된다. 서울 내 대저택에 거주하고, 어느 회사의 사장으로 보여지는 박사장 가족의 ‘부’는 기택과 문광의 가족과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하는 듯하다. 박사장네도 감독의 연출 속에서는 우스운 존재이다. 아는 사람 소개라면 수백만 원을 쉽게 쓰며. 의심 또한 하지 않는 것을 보아 감독의 연출 속의 박사장은 돈 많은 ‘호구’로 표현되는 것 같다. 박 사장네는 한우 채끝살과 인스턴트 라면, 즉 짜파구리를 어울리게 요리하여 즐길 수 있다. 이것 또한 서민의 흉내를 내는, 멍청한 부자를 풍자한다. 박 사장네 집에는 계단이 많다. 가족들은 계단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한다. 그러나 박 사장네 고용된 기택의 가족과 박사장 사이에는 계단이 존재하고, 문광의 남편이 기생하고 있는 지하 방공호와 기택의 가족이 일하고 있는 1층 사이에도 계단이 존재한다. 이 계단은 계층을 의미하며, 그들은 계단을 사이에 두고 다툼을 벌인다. 계단에 대한 연출은 감독 김기영이 사용한 연출과 매우 흡사하며 상징성도 흡사하다. 영화 속 계단은 계층과 올라갈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함으로 관객은 세 가족이 계단으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고 섞일 수 없고 역전할 수 없는 사회를 영화를 통해 인식하게 된다.
기생충 속 세 가족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으나, 부에 집착하며 오를 수 없는 계단에서 탈출하기 위해 부단히 애쓴다. 감독은 계층 싸움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의 사이도 풍자한다. "아줌마는 쌔고 쌨으니 또 구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박 사장은, 노동자를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 정도로 생각한다. 급여를 지급하는 입장인 자본가는, 사람으로서의 노동자보다는, 정해진 규격에 맞춰 일할 수 있는 규격화된 노동자를 원하는 사회적 모습을 감독은 효과적으로 연출했다. 영화 ‘기생충’은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 돌풍을 일으켰고, 상업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영화사에 심었다. 그러나 계층 밑에 있는 존재, 즉 소수자와 억압받는 노동자의 당사자성에 대한 섬세한 연출은 실패했다. 또한 감독의 연출은 단순히 제3의 눈으로 여길 수 없을 만큼 사회적 약자들을 맹렬하게 희화화시켰다. ‘희화화’와 ‘풍자’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약자가 강자를 묘사하고 연출할 때라는 ‘불문율’을 파괴한 시점에서, 혁명적인 영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켠이 불편한 영화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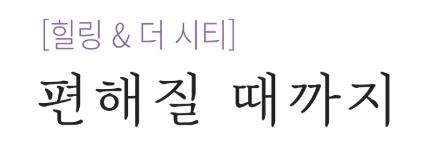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주홍콩대한민국 총영사관], 2025년도 제4차 기업지원협의회 개최
[주홍콩대한민국 총영사관], 2025년도 제4차 기업지원협의회 개최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30일 (금)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30일 (금)
 JEWELPARK(H.K.) 채용공고
JEWELPARK(H.K.) 채용공고
 [Stella A&C] 전북 전통주, 홍콩에서 K-Craft 주류로 재조명
[Stella A&C] 전북 전통주, 홍콩에서 K-Craft 주류로 재조명
 [1015호] 2024년 12월 27일
[1015호] 2024년 12월 27일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