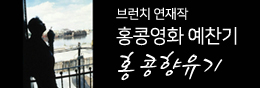- [제115호, 2월24일]
1. 자기 일 아니면 '만만디'
돈 되는 일에는 '급발진'
&nbs..
[제115호, 2월24일]
 1. 자기 일 아니면 '만만디'
1. 자기 일 아니면 '만만디'
돈 되는 일에는 '급발진'
"중국인이 만만디라니…"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최대 교역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길목이며, 한류(韓流)에 열광하는 중국은 장밋빛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고구려사 왜곡에서는 패권주의라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한국인은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중국과 중국인의 참모습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중국 남부에선 '비상구(非常口)'를 '태평문(太平門)'으로 불렀다. 대만과 홍콩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 어느 언론인은 이를 "중국의 대륙적 기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했다. "생사를 다투는 비상구 앞에서 태평스러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중국식 여유"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중국인이 비상구를 태평문으로 부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중국에선 영안실, 즉 시체 안치실을 '태평간(太平間)'이라 한다.
또 영안실뿐 아니라 모든 문에 '태평출입(太平出入)'이라고 써 붙여 둔다. 출입을 관장하는 신에게 안녕을 비는 말이다.
중국인들은 사람의 탄생과 죽음에 관련된 모든 제례와 출입을 관장하는 '태평신 (太平神)'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상구를 태평문으로 부르는 것은 '위급한 시기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는 주술적 기원이 담긴 표현에 불과하다. 대륙적 기질과는 상관이 없다.
'만만디(慢慢地, 천천히)'는 중국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 표현이다. 뒷차가 아무리 경적을 울려대도 느긋하게 제 갈 길을 가는 자전거, 효율이라는 단어는 전혀 모르는 듯 한 일처리, 내 일이 아니면 천하에 누가 뭐래도 새겨듣지 않는 태도에서 만만디를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인들은 "도대체 누가 중국인을 만만디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찬다. 돈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에서만은 한국인의 '빨리 빨리'를 제압하고도 남는다. 병아리를 채가는 날쌘 매처럼 자신의 이해가 걸린 일에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달려드는 게 중국인이다.
'빨리빨리'한국보다 더해
중국식 '빨리 빨리'의 전형은 거리에서 나타난다. 중국의 도시 교통은 '아스팔트가 깔린 정글'로 표현된다. 틈새를 파고드는 잽싼 운전 기술은 '무공불입(無孔不入, 들어가지 못하는 틈새가 없다)'으로 표현된다. 그런가 하면 뒤로 처지면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앞으로 돌진하는 행위는 '쟁선공후(爭先恐後, 선두를 다투고 뒤로 처지는 것은 두려워한다)'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2년여 자동차 정비를 해온 사람은 중국인의 기질을 이렇게 표현했다. 브레이크의 라이닝을 잡아주는 석면과 쇠로 만든 부품인 브레이크 패드의 경우 "한국인들이 운전하는 차에 비해 중국인들이 모는 차는 30%가량 더 빨리 마모된다"는 것이다. 급발진과 급브레이크, 급회전 때문이다. 그로 인해 타이어의 편(偏)마모 현상도 심하다. 마모된 부분이 톱니바퀴처럼 떨어져 나가는 현상도 잦다고 한다.
'삼국지' 인상은 버려야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어릴 때 읽었던 '삼국지'에 기반을 둔 것이다. 만만디와 영웅주의적 시각으로 중국을 본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둘째는 찬란한 중화 문명에 대한 동경이다. 한자로 대변되는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무조건 선망한다.
셋째는 중국인이 모두 음흉. 교활하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인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헛된 자존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중국은 말 그대로 '문명 대국'이다. 오랜 전통과 역사, 이로부터 축적된 수많은 관행과 지식, 그리고 지혜가 두껍게 쌓여 있다. 또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중국인들에겐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그늘 또한 짙다. '만만디'로 대표되는 단편적인 시각만으론 중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없다.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벌이는 오늘의 중국인들에겐 그들의 역사와 집단적 경험이 모두 녹아 있기 때문이다.
2. 속내 꼭꼭 감추는 '담장 문화'
사무실마다 높다란 칸막이…영역 침범은 금물
북경에는 유난히 담장이 많다. 평균 높이 11m의 붉은 담이 쳐진 자금성(紫禁城), 중국 지도부가 모여 사는 중난하이(中南海), 골목마다 사방을 메우고 있는 전통 가옥 사합원(四合院), 무장경찰이 지키는 각종 관공서 등은 모두 높은 담으로 꼭꼭 둘러싸여 있다. 베이징 북쪽엔 만리장성이 버티고 있다. 길이 6000㎞. 중국의 안전과 부(富)를 지키려 했던 거대한 벽이다. 사합원은 높은 담장에 파묻혀 있다. 담장엔 밖을 내다 볼 수 있는 창이 거의 없다. "안일함의 추구, 밀폐된 구조" 중국 현대 소설가 류신우(劉心武)의 평이다.
중국인의 담 쌓기는 요즘도 계속된다. 중국 회사의 사무실은 한국인들에겐 답답하게 느껴진다. 입구 한가운데를 막고 있는 칸막이 탓이다. 중국의 전통 가옥에서 안쪽 뜰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정문 바로 뒤에 세우는 '조벽(照壁)'의 연장선이다.
사무실에 들어서도 '무언가 가려져 있다'는 인상을 떨치기 어렵다. 직원들 사이의 업무 공간을 나눈 칸막이가 유난히 높고 또 많기 때문이다. 까치발을 해도 쉽게 안을 들여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중국인의 생활에는 담과 칸막이, 그리고 조벽의 심리가 그대로 녹아 있다. "중국엔 일반적으로 상품을 팔 때 남에게 제시하는 가격표 격인 '오퍼 시트'가 아예 없습니다." 중국 상인은 절대로 제품의 희망 판매가를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인 사업가들의 말이다. 백이면 백 모두 그렇다. 대신 "당신 얼마에 사겠소?"로 흥정을 시작한다. 나를 감추고 먼저 상대를 재는 것이다.
외국인이 중국인의 담을 넘기는 쉽지 않다. 중국인조차 서로의 담을 잘 침범하지 않는다. 중국 회사에선 직위가 높아도 부하 직원의 칸막이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모든 것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한국과는 다릅니다. 중국인은 꼭 필요한 사항 외엔 상사에게 알리지 않지요." 오히려 상사가 부하의 담을 넘어 모든 것을 알려고 할 때 중국식 업무의 틀은 망가진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담과 담 사이를 연결하는 게 있다. 바로 '관시(關係)'다. 관시란 사적으로 구축된 인간관계를 말한다. 관시를 통해 부하 직원은 외부와 연결돼 있고 업무는 이를 통해 진행된다. 아무리 높은 상사라도 개인적인 관시의 네트워크를 건드렸다가는 부하도 잃고 업무도 망친다. 개인적 연결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중국 사회는 그래서 비밀주의와 개인주의가 극성을 부린다. 제도적인 칼로 관시망을 베려면 전국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아니, 그럴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지대물박(地大物博)'. 거대한 땅과 풍부한 물자 덕에 중국인들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담을 쌓아 내 것만 차지해도 충분하다는 의식이 뿌리 깊다. 담의 문화는 정치적으로 '중화주의(中華主義)'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내부에 모든 것을 완비하고 있으며 내가 세계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에서 '천하 (天下)'라는 관념이 만들어졌다. 중국인들은 지금도 이 같은 중화적 자부심을 곧잘 내세운다.
중국이 다시 담을 쌓고 있다. 이번에는 역사의 담이다. 현재의 영토에서 활동했던 다른 민족의 역사를 모조리 자신의 역사 안으로 끌어넣으려는 작업이다. 억지가 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고구려사 왜곡의 심리적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질기다.
사합원이란
베이징과 중국 동북 지방의 전통적인 가옥 형태다. 남북을 긴 축으로 하며 북쪽에 안채 격인 정방(正房)이 자리한다. 그 양 옆으로 두 곁채(廂房)가 늘어선다. 맞은편엔 행랑채(倒座)가 위치한다. 모든 건물은 가운데 정원을 에워싸고 있다. 주택의 사면이 담으로 둘러싸여 바깥과는 완전히 차단된 느낌을 준다.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영화가 이미지로 기억된다는 것, <천장지구>
김수진영화가 이미지로 기억된다는 것. 영화 속 장면들이 계속해서 아이콘화되어 회자되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는 오래도록 회자되는 홍콩영화일만 하다. 1990년에 개봉한 천장지구는 개봉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진목승 감독의 초기작이었고, 이 영화 이후 홍콩 액션 영화의 거장으로 자리잡기도 했으며 천장지구가 큰 인기...
영화가 이미지로 기억된다는 것, <천장지구>
김수진영화가 이미지로 기억된다는 것. 영화 속 장면들이 계속해서 아이콘화되어 회자되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는 오래도록 회자되는 홍콩영화일만 하다. 1990년에 개봉한 천장지구는 개봉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진목승 감독의 초기작이었고, 이 영화 이후 홍콩 액션 영화의 거장으로 자리잡기도 했으며 천장지구가 큰 인기...

 쌍용관 태권도, 전통 태권도를 알리고 축제의 장을 마련
쌍용관 태권도, 전통 태권도를 알리고 축제의 장을 마련
 [모닝 하이라이트] 2024년 12월 20일 (금)
[모닝 하이라이트] 2024년 12월 20일 (금)
 2025 홍콩한인상공회 신년하례회
2025 홍콩한인상공회 신년하례회
 HUROM홍콩 <당근퓨레전>
HUROM홍콩 <당근퓨레전>
 [1014호] 2024년 12월 20일
[1014호] 2024년 12월 20일

 목록
목록




 1. 자기 일 아니면 '만만디'
1. 자기 일 아니면 '만만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