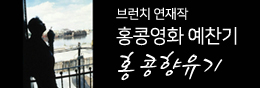임나은
미스테리한 느낌을 자아내는 현악기의 선율과 함께 색이 바랜 악보와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바이올린, 오르골을 차례로 비추며 영화의 막이 오른다. <야반가성>은 10년 전 북경 최고 갑부의 딸 운언과 전설적 배우인 단평의 이야기, 그리고 청묘극단의 단원이자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위청과 남접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며 비춘다. 중반부까지는 액자식 구조처럼 운언-단평의 서사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만 전달되다가 단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위청이 알게 되면서 운언과 단평이 액자 밖으로 튀어나와 현대의 서사와 연결된다. 네 인물은 시대를 넘나들며 화재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극장이라는 공간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확장한다. 사랑하는 연인을 지키기 위해 서로 연대하고, 사랑을 가르려는 불의와 감히 맞서기도 한다.

무서운 소문이 그득한 극장과 화재로 얼굴이 그을린 단평, 그리고 그의 연인 운언만 떠올린다면 단평과 운언을 <오페라의 유령>에 등장하는 에릭과 크리스틴에 비유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인 로미오와 줄리엣에 불과하다. 타이밍이 맞지 않는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와 서로를 향한 순애보적인 마음이 영화 전반에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평의 무대가 끝나면 빈 극장에 남아 사랑을 나누며 미래를 약속하곤 했다. 신분의 차이로 주변의 반대가 있었어도 끝끝내 두 사람의 사랑을 갈라 두지는 못한다. 운언은 미쳐버리고 단평은 극장에서 숨어 사는 신세가 됐지만, 결국 둘의 재회와 함께 해피 엔딩으로 막을 내렸으니 캐플렛과 몬테규 가문의 결말보다는 훨씬 나은 셈이다. 오히려 단평과 위청의 서사가 <오페라의 유령>과 엇비슷하게 진행된다. 위청은 단평에게 <로미오와 줄리엣> 대본뿐만 아니라 개인 레슨을 받기도 한다. 단평과 위청이 함께 힘을 모아 무대를 성공적으로 올리는 장면은 무대 지하에서 'Phantom of the Opera'를 같이 부르던 에릭과 크리스틴을 연상케 한다. 결국 단평은 전설적인 배우를 넘어 위청과 극단을 구원해준 '음악의 천사(Angel of Music)'로 자리매김한다.

‘언젠가는 내 소원을 이루어, 그대와 함께 영원을 찾아 날아갈 겁니다(總會有一天把心願完成, 帶著妳飛奔找永恆).’ <오페라의 유령>의 넘버는 주인공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영화, 특히 음악을 주제로 하는 영화에서도 사운드트랙은 작품 자체의 매력 척도와 직결되고, 끊임없이 뇌리에 박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야반가성> 또한 카메라 밖이 아닌 작품 안에서 등장하는 OST가 영화를 떠올리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수단이다. 대표적인 OST인 ‘야반가성(夜半歌聲)’은 단평과 운언의 애틋한 사이를 효과적으로 부각한다. 까만 밤, 달과 별을 부르며 서로를 떠올리려는 노래의 가사는 ‘로미오와 줄리엣’ 무대를 돋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드러내지 않으면 더 강조된다고 했던가. 서정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선율로 표현되는 간접적인 사랑 타령이 더 애절해 보이는 건 비단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야반가성>의 모든 등장인물이 단평과 얽혀 있다 보니 극의 흐름 또한 단평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막무가내로 공연을 중단시켜도 무대에서 큰 목소리로 관객의 호응을 유도해서 되려 악역에 한 방 먹이는 영웅적 면모, 한 여성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구애. 거기에 힘입어 장국영의 독보적이면서도 수려한 외모로 세기를 풍미했던 두 캐릭터 로미오와 에릭을 자처하는데 단평의 존재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만큼 영화가 장국영이 연기하는 송단평의 존재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 즉, 전체적인 완성도보다는 주인공 한 명에 더 힘을 주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두 소설의 결말이나 전개를 그대로 차용하고, 극이 짜임새 없이 종종 진행돼 90년대 영화임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고전 소설의 결말을 뒤집거나 유쾌하게 풍자하는 똑똑한 극이 많아진 현재에서 <야반가성>의 작품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재에서 바라보는 과거는 뻔하고 뒤처진 이야기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을 쉽게 대상화하고 순결을 들먹이며 하대하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만 봐도 낡은 영화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90년대의 관객이 되어, 조금은 흐린 눈으로, 다시 이 작품을 감상한다면 유명한 극인 <로미오와 줄리엣>과 <오페라의 유령>을 적절히 조합해 완벽하게 동양풍으로 재현한 최고의 클래식 영화가 될 테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릿하고 어딘가 먹먹한 기분이 드는 것은 별수 없는 일이다. 단평과 운언이 나누는 한밤의 세레나데는 선선한 밤공기 속 왠지 모를 떨림을 가늠해보게 한다. 누군가는 유치하고 뻔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원래 그렇고 그런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돌고 도는 법이니까.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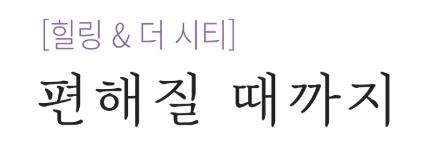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주홍콩대한민국 총영사관], 2025년도 제4차 기업지원협의회 개최
[주홍콩대한민국 총영사관], 2025년도 제4차 기업지원협의회 개최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30일 (금)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30일 (금)
 JEWELPARK(H.K.) 채용공고
JEWELPARK(H.K.) 채용공고
 [Stella A&C] 전북 전통주, 홍콩에서 K-Craft 주류로 재조명
[Stella A&C] 전북 전통주, 홍콩에서 K-Craft 주류로 재조명
 [1015호] 2024년 12월 27일
[1015호] 2024년 12월 27일

 목록
목록